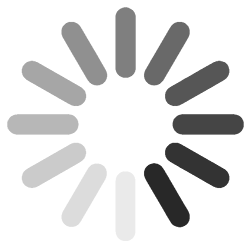2. 현실의 관찰
1) 법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나이다. 이 법은 현실에서 밝혀진 것이며, 머지않아 과보가 있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잡아함경』 「제46, 1238경」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 진리의 내용은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에 이미 밝혀져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이나 그것을 담은 경전을 바로 법보(法寶)라고 한다. 법, 즉 진리는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거기에는 불교와 삶의 핵심이 담겨 있다. 법은 우리를 해탈과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법은 누구나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체험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효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법을 깨닫다' '법을 본다' '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중요한 체험이다.
법의 산스끄리뜨어는 '다르마(dharma)'이고 빨리어로는 '담마(dhamma)'라고 한다. 이 말의 어원을 찾자면 인도 고전인 『베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다시대에 법은 리타(rta)로 불렸으며, 그것은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였다. 빨리어 주석에 따르면 다르마는 '인(因)' '덕' '가르침' '사물(事物)'의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르마가 불교에서 '법의 내용을 이루는 진리 그 자체', 또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깨달음을 보여 주는 진리', 또는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에서 자주 쓰는 '법'이라는 말은 바로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나아가 법은 존재, 사물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제법(諸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의 법의 의미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근본적 존재도 법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법의 개념은 불교의 독자적인 것이다. 이러한 법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면 이렇다.
첫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을 일컫는다. 삼보의 법보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법이라고 말할 때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사물을 일컫는다. 제법무아의 법, 연기에 의해 성립된 존재인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에서 '모든 법의 공한 모양(諸法空相)'이라고 말할 때의 법이 이런 용례에 해당된다.
셋째, 불교 경전을 일컫는다.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전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전은 삶의 기준이자 모든 것의 척도이다.
이와 같이 법의 개념은 다양하며, 경전과 논서에 쓰일 때는 진리와 교법이라는 의미 외에도 '존재'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12처, 18계
초기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부처님은 신이나 형이상학적인 원리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를 중요시하셨다.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가치는 뛰어나다. 12처와 18계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움직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법(一切法)은 십이처에 포함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일체란 세계 전체요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
바라문이여, 일체는 십이처에 포함되는 것이니, 곧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
『잡아함경』 「권13」
처(處)란 들어가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12가지 장소에 들어가 머물며 그 외의 것은 없다는 말이다. 12처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가지 인식주관과,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6가지 인식대상을 일컫는다. 여기서 6가지 인식주관을 육근(六根)이라고 하고, 6가지 인식대상을 육경(六境)이라고 한다.
안·이·비·설·신·의는 눈·귀·코·혀·몸·의지(마음)이며, 색·성·향·미·촉·법은 형색·소리·냄새·맛·감촉·마음의 대상인 법이다.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촉감을 느끼며, 의지인 마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진리를 안다.
그렇다면 왜 일체가 십이처이며 십이처에 들어가 머문다고 했을까? 그것은 일체, 즉 세계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관은 느끼고 사유하는 인식주체를 말하며 객관은 자연환경이요 대상과 이치를 말한다. 인간을 비롯한 해와 달,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기는 동물들, 수다한 갖가지 소리와 냄새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세상 중에서 이러한 12처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는 없다.
또한 주관과 객관의 작용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며 행위를 한다. 즉 육근과 육경의 십이처는 우리들이 보고·듣고·냄새 맡고·맛보고·접촉하고·생각하는 활동의 세계이며 생활세계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를 떠나서 설명되는 말은 믿을 수 없거나 허황된 말일 수 있으며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 또한 크다.
불교에서는 이 육근과 육경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육근과 육경 역시 무상하며 무아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이 세계가 잠시도 머무름 없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8계(十八界) 또한 일체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12처에다가 6가지 인식의 세계를 합하여 18계라 한다. 계(界)란 종류, 영역을 말한다. 여기서 각각의 계는 다른 계와 섞이지 않는 공통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이 서로 다른 18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18계라고 한다. 말하자면 안계(眼界)부터 의계(意界)까지의 6가지 주관세계, 색계(色界)부터 법계(法界)까지의 6가지 객관세계, 6가지 주관세계와 6가지 객관세계가 서로 작용하여 인식이 형성되는 6가지 인식의 세계를 합하여 18계라 하는 것이다.
6가지 인식의 세계를 육식(六識)이라 한다. 즉 눈으로 형색을 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안식계(眼識界)이고, 귀로 소리를 인식하는 세계가 이식계(耳識界)이며, 코로 냄새를 인식하는 세계가 비식계(鼻識界)이며, 혀로 맛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설식계(舌識界)이며, 몸으로 접촉하여 인식하는 세계가 신식계(身識界)이며, 의식으로 마음의 대상을 인식하는 세계가 의식계(意識界)이다.
대승불교시대에는 눈의 인식작용부터 몸의 인식작용까지를 의식과 구별하여 전오식(前五識)이라 했다. 전오식이 오감을 통하여 감각적 대상을 알아차리는 기능을 한다면, 의식은 그것들을 종합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컨대 저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고 할 때, 안식은 걸어오는 그 사람을 시각을 통해 보고 인식하는 기능, 이식은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나 목소리를 인식하는 기능, 비식은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 기능 등을 한다면, 의식은 전오식으로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감각 자료를 나의 과거의 기억과 종합하여 그 사람이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가치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부처님께서는 18계 또한 무상이요 무아라고 했으며, 여기에 포함된 육식도 그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므로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셨다. 우리들의 인식의 세계나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찰라적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그냥 느끼되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서 욕망과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혀로 맛을 느끼되 탐착하지 않으면 과식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아가 모든 존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일체법 중 12처가 물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18계는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음에 설명할 삼법인에서는 이러한 일체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